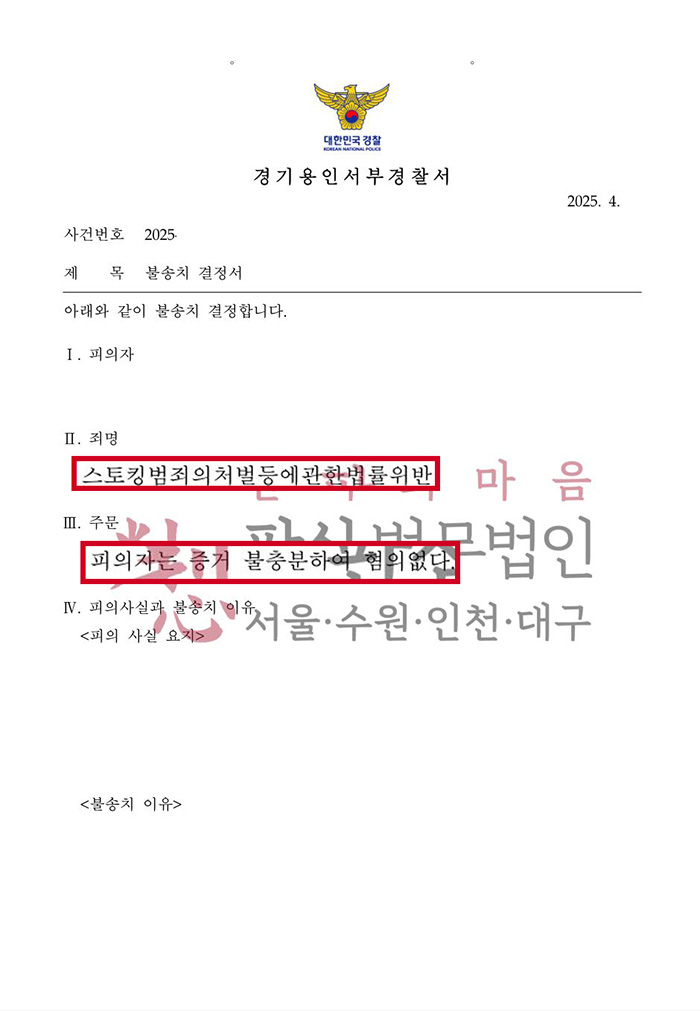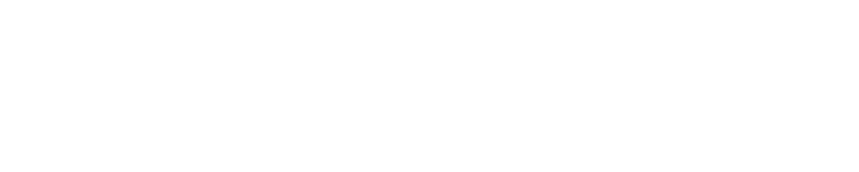의뢰인은 과거 짧게 교제했던 여성과 결별한 이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해당 여성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실제 정황은 고소인의 주장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과거 연인 관계였으며, 결별 이후 오히려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 연락을 받았고, 장난스럽게 만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이 과거의 연인이었던 고소인에게 단순히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성립요건인
①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
②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
③ 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
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다툼이 핵심이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방면의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우선 고소인의 일방적인 피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연락내역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일자별로 정리하여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먼저 장난스럽게 “밥 먹자”, “카페 가자”, “집 앞에 와봐” 등의 문구를 수차례 보낸 내역을 입증자료로 정리하여, 이 사건의 진정한 맥락을 드러냈습니다.
2)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이 금지하는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의뢰인이 단지 과거의 연인이 떠올라 무심결에 전화를 건 것이고, 통화 연결 시 아무 말 없이 끊었으며, 어떠한 위협적 발언이나 언행이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고소인이 명시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표현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연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사실조차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친구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걸어와 항의한 뒤 연락처를 차단한 사정을 들어, 피의자가 연락 금지 의사를 정확히 인지할 기회조차 없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4)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중대한 신체적 위해를 수반할 수 있는 반복적 괴롭힘을 제재하기 위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본 사안은 그러한 입법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매우 경미한 접촉이었으며, 의뢰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주장과 관련 증거,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자료의 전문성과 정합성 측면에서 높은 설득력을 확보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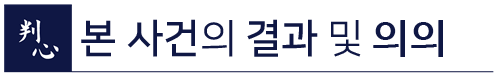
담당 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태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락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